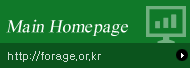Ⅰ. 서론
최근 논소득기반다양화사업 및 안정적인 양질 조사료 공급 증 대를 위해 논 이모작 재배에 정부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며 겨울철 사료작물 재배를 권장하고 있다(MAFRA, 2024). 겨울철에 사료용으로 재배할 수 있는 맥류는 귀리, 청보리, 밀, 트리티케일, 호밀 등이 있다. 이 중 트리티케일은 품질이 우수한 밀과 내한성이 강한 호밀의 장점을 조합하기 위해 듀럼밀(Triticum durum L.) 혹은 빵밀(Triticum aestivum L.)과 호밀(Secale cereal L.)의 교잡으로 만들어진 작물이다(Lukaszewski and Gustafson, 1987). 트리티케일은 야생에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종으로써 대부분 6배체 게놈(AABBRR) 혹은 8배체 게놈(AABBDDRR)을 가지고 있으며, 6배체의 트리티케일이 8배체 트리티케일보다 생장 활력이 좋고 임실율이 안정적이어서 주로 재배종으로 활용되고 있다 (Brrigs., 2001). 트리티케일은 밀이 제대로 자라지 못하는 농경지에서도 적응성이 뛰어나고 수량이 많기 때문에 사료용으로 많이 재배되고 있으며(Bilgili et al., 2009;Harmoney and Thompson, 2010;Faccini et al., 2023), 풋거름 및 피복작물로 이용되고 있기도 하다(Kim et al., 2012;Ayalew et al., 2018). 또한 트리티케일은 수량과 환경에 대한 내재해성이 밀보다 강하고(Kim et al., 2017), 건초나 사일리지 수량이 호밀 등 다른 맥류에 비해 높은 특성을 지녔다(Bishnoi et al., 1979). 한편 Poysa (1985)는 캐나다 온타리오 주에서 트리티케일 조사료 수량이 밀보다는 높았으나 호밀보다는 낮았다고 보고하여 지역에 따라 다른 생산성을 보이고 있다. Larter et al. (1968)은 조사료 품질 측면에서 트리티케일의 조단백질 함량이 밀이나 호밀의 조단백질 함량보다 높았다고 하였다. 국내에서 교잡 육종한 조사료용 트리티케일 품종은 ‘신영’(Park et al., 2003), ‘조성’(NICS, 2011), ‘세영’(NICS, 2013). ‘조영’(NICS, 2015), ‘신성’(NICS, 2016), ‘민풍’(NICS, 2017), ‘광영’(NICS, 2019) 등 다수의 품종이 개발되었지만 도복에 강하면서 조생이고 내한성이 강한 품종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조생이면서 내한성이 강하여 중ㆍ북부지역에서도 재배가 가능한 조생 트리티케일 ‘옹골진’을 개발하여 그 육성 경위와 주요 특성을 보고하고자 한다.
Ⅱ. 재료 및 방법
1. 육성경위
트리티케일 ‘옹골진’의 육성 경과는 Fig. 1과 같다. 4월 30일 전에 출수하는 조생이면서 조사료 수량이 많고 잘 도복되지 않으며, 중북부지역에서 월동재배가 가능한 품종을 육성하고자 CIMMYT (International Maize and Wheat Improvement Center in Mexico)에서 도입한 조생이고 내도복성이며 보리호위축병(Barley yellow mosaic virus, BaYMV)에 강한 CTSS93Y00058S-5Y-0Y-0B를 모본으로 하고 추위와 도복에 강한 수원24호를 부본으로 하여 국립식량과학원에서 2003년 4 ∼5월에 교배하였다. 인공교배 후 계통육종법에 따라 계통선발을 거듭하여 F12 세대 우량계통인 ‘ST03032-B-48- 12-2-8-6-3-5-10-6-12’를 선발하였다. 이 계통은 생산력검정시험을 거쳐 2018년에 ‘수원65호’로 계통명을 부여하고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지역적응시험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수원65호’는 기존 품종에 비해 내한성, 내도복성 등 재해에 강하고 수량도 많아 2020년 9월 농촌진흥청 농작물 직무육성 신품종선정위원회에서 직무육성품종으로 결정되었으며, 이후 품종명이 ‘옹골진’으로 명명되었다. 옹골진의 가계도는 Fig. 2와 같다.
2. 재배방법 및 농업적 특성 조사
지역적응시험은 2010년에 육성된 ‘조성’을 대조품종으로 하여 전국에 걸쳐 6개 지역에서 실시하였다. 지역 및 재배 유형은 경기 수원, 충북 청주에서는 전작으로, 전북 전주, 전남 강진, 경남 진주, 대구에서 답리작으로 실시하였다. 파종시기는 수원, 청주, 대구는 10월 중순, 전주, 강진, 진주는 10월 하순이었다. 파종방법은 수원은 40 cm × 4 m (휴폭 × 휴장), 6열 조파로써 시험구당 면적 9.6 ㎡로 하였고, 청주는 25 cm × 6 m, 6열 (9.0 ㎡)의 세조파로 하였다. 답리작 재배지인 전주, 강진, 진주, 대구에서는 150 cm × 6 m, 1열 (9.0 ㎡)의 휴립광산파로 하였다. 지상부건물중 생산량 조사를 위한 시험구 파종량은 전작에서 180 kg/ha, 답리작에서 220 kg/ha 로 하였다. 시비량은 ha당 118-74-39 kg (N-P2O5-K2O)으로 하였다. 질소는 기비로 50%, 월동후 생육재생기에 추비로 50%를 주었고, 인산과 가리는 전량 기비로 시용하였다. 종실생산량 시험은 육성모지인 수원에서 ha당 140 kg을 파종하여 조사하였다. 시비는 ha당 91-74-39 kg으로 하였고 질소는 기비 50%, 추비 50%로 시용하였다. 내한성검정은 1월 일평균최저온도가 –8℃이고 극최저온도가 –20℃ 이하로 내려가는 경기도 연천군에 소재한 국립식량과학원 연천시험지(38°10′23″N, 127°06′11″E)에서 수행하였다. 10월 상순에 휴폭 40 cm, 휴장 1.5 m의 이랑을 조성하여 저휴와 고휴에 시험계통을 각 1줄씩 2반복 파종하여 월동시킨 후, 생육재생이 시작되는 이듬 해 3월 상순에 동사한 개체 비율과 생존개체의 잎마름 비율을 조사하여 내한성을 평가하였다. 내한성의 품종간 정확한 비교 평가를 위하여 수원과 연천에서 2024년도에 월동후 잎마름비율을 추가로 조사하였다. 시험구 배치는 모든 시험지에서 난괴법 3반복으로 하였다. 기타 재배관리는 농촌진흥청 표준재배법에 준하였고, 지역적응 시험지에서의 주요 농업형질, 수량구성요소, 내한성 및 병충해 저항성 등의 관련 조사는 농촌진흥청 신품종개발공 동연구사업 과제수행계획서(RDA, 2018;RDA, 2019;RDA, 2020)와 농업과학기술 연구조사분석기준(RDA, 2012)에 준하였다. 통계분석은 R program (Ver. 3.6.1, 2020)의 agricolae pakage (de Mendiburu, 2020)를 이용하였다.
3. 조사료 생산성 및 사료가치 평가
조사료 생산성을 평가하기 위해 출수 후 30일경에 지상부 전체를 수확하였다. 시험구면적은 9.6 ㎡, 난괴법 3반복으로 하였으며, 생초수량은 각 시험구 별로 즉시 예취하여 평량한 다음 ha당 수량으로 환산하였고, 건물수량은 생초수량 1 kg을 취하여 70 ± 2℃ 순환식 송풍 건조기 내에서 72시간 건조 후 평량하여 건물률을 산출한 다음 생초수량을 곱하여 ha당 수량으로 환산하였다. 건조시킨 시료는 사료가치 분석을 위하여 전기믹서기로 분쇄 후 지퍼비닐 봉투에 밀봉하여 보관 후 조사료 분석용 시료로 이용하였다. 조단 백 함량은 Nitrogen Determinator (TruMac; Leco, St Joseph, MI, USA)로 총질소함량을 구한 후 6.25를 곱하여 산출하였고, 산성세 제불용성섬유소(acid detergent fiber, ADF) 함량과 중성세제불용 성섬유소 (neutral detergent fiber, NDF) 함량은 Van Soest (1991) 의 방법을 적용한 Fiber Analyzer (ANCOM2000; Macedon, NY, USA)로 분석하였고, 가소화양분총함량(total digestible nutrient, TDN)은 88.9 - (0.79% × ADF)의 계산식을 이용하여 산출하였다 (Schroeder, 2004). 사일리지 제조 및 분석은 출수 후 30일에 수확한 생초를 작물줄기파쇄기로 세절하여 수분함량이 60 ∼70% 범위가 되도록 햇볕에 예건 후 10 L 플라스틱시험용사일로에 충진한 후 공기를 빼내고 밀봉하여 빛이 투과하지 않는 검은 비닐봉투로 완전히 감싸서 실내에 40일을 보관한 후 개봉하여 분석하였다. 사일리지의 pH는 사일리지 10 g을 증류수 100 mL에 넣고 4℃ 유지 진탕기에서 24시간 진탕 추출 후 여과지(No. 1, ADVANTEC)에 걸러 측정하였다. 추출액은 분석에 이용할 때까지 –20℃에 냉동 보관하였다. 유기산 함량의 분석은 액체크로마토그래프(Acquity UPLC H class Plus; Waters Co, Milford, MA, USA)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Kim et al., 2016). 사일리지 pH를 바탕으로 한 Flieg 점수와 총유기산 함량을 바탕으로 한 Flieg 점수를 평균하여, 그 점수에 따라 사일리지 등급을 산정하였다(Sariçiçek and Kilic, 2009). 분석은 완전임의로 3반복으로 하였고 통계분석은 R program을 이용하여 t-test로 유의성 검정을 실시하였다.
-
- Flieg point = 220 + (2 × % dry matter – 15) - 40 × pH)
-
- Flieg silage grade : 1 등급 (81 ∼100, 우수), 2 등급 (61 ∼80, 양호), 3 등급 (41 ∼60, 보통), 4 등급 (21 ∼40, 불량), 5 등급 (0 ∼20, 부적합)
Ⅲ. 결과 및 고찰
1. 고유특성
트리티케일 품종 ‘옹골진’의 고유특성은 Table 1과 같다. ‘옹골진’은 잎색은 녹색이고 잎몸 폭은 대비품종인 ‘조성’에 비해 좁다. 꽂밥의 안토시아닌 착색은 없으며, 이삭 길이는 짧고, 까락 길이는 ‘조성’에 비해 길다. 종실의 색은 황갈색이고 종실 길이와 두께가 ‘조성’보다 짧고 얇다. ‘옹골진’은 기존 육성된 품종과 비교하여 ‘신영’보다 이삭목 털 밀도가 많고, ‘세영’보다 잎몸의 폭 이 넓고, ‘조영’, ‘신성’, ‘광영’, ‘민풍’과는 잎몸의 폭이 좁다 (NICS, 2019). ‘옹골진’의 유숙 초기의 식물체 모습은 Fig. 3와 같다.
2. 출수기
‘옹골진’의 출수기는 Table 2와 같이 전국 평균이 4월 23일로 대조품종인 ‘조성’보다 2일 늦었다. 지역별 ‘옹골진’의 출수기는 대구에서 평균 4월 20일로 가장 빨랐고, 수원에서 4월 28일로 가장 늦었으며, 수원과 대구 간에는 8일의 출수기 차이를 보였다. 대조품종인 ‘조성’은 대구에서 ‘옹골진’과 같이 4월 17일로 출수가 가장 빨랐으나, 청주에서 4월 26일로 가장 늦어 ‘옹골진’과 ‘조성’ 간에 출수가 가장 늦은 지역은 달랐다. 출수가 빠른 날과 가장 늦은 날 사이의 차이는 ‘옹골진’은 7일, ‘조성’은 9일로써 ‘옹골진’의 출수기 범위가 ‘조성’보다 2일 좁았다. 기존 육성된 품종의 육성당시의 보고된 연구결과에 따르면 ‘옹골진’보다 출수기가 빠른 품종은 ‘광영’(4월 22일), ‘민풍’(4월 22일)이었고, ‘옹골진’보다 출수기가 늦은 품종은 ‘신영’(5월 12일), ‘세영’(5월 3일), ‘조영’(4월 28일), ‘신성’(4월 24일)이었다(NICS, 2019).
3. 조사료 수량구성요소
조사료 수량에 많은 영향을 주는 초장, ㎡당 경수는 Table 3과 같다. ‘옹골진’의 초장은 시험지 전체에서 평균 134 ㎝로 대조품종인 ‘조성’의 126 ㎝에 비해 8 ㎝ 컸으며, ㎡당 경수는 704개로 ‘조성‘의 628개 보다 76개 많았다. 따라서 ‘옹골진’은 ‘조성’에 비해 초장이 길고 줄기 수가 많아 조사료 수량이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기존 육성된 품종 중 ‘옹골진’보다 긴 초장을 가진 품종은 ‘광영’이었고, ‘옹골진’보다 작은 초장을 가진 품종은 ‘신영’, ‘세영’, ‘조영‘, ’신성‘, ’민풍’이었다(NICS, 2019).
4. 내재해성
중북부지역에 위치한 연천지역(1월 일평균최저기온 –8℃)에서 2018년도에서 2020년도까지 월동율을 조사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저휴재배시 고휴재배보다 월동율이 높았다. 저휴에서는 ‘옹골진’은 3년간 동사한 개체없이 100% 월동하였고, ‘조성’은 평균 91%의 월동율을 나타냈다. 고휴에서는 ‘옹골진’이 평균 95% 의 월동율을 나타냈고 91 ∼ 100%의 월동율 범위를 보여 안정적인 월동율을 보였지만, ‘조성’은 평균 52%의 낮은 월동율을 나타냈고 2 ∼ 100%의 월동율 범위를 보여 해에 따라 월동율이 극심한 불안정을 보였다. 수원과 연천지역에서 평가한 월동 후 잎마름 정도는 Table 5와 같다. 수원에서의 월동 후 잎마름 정도는 ‘옹골진’은 1로써 월동 중 동해에 의한 잎의 손상 정도가 상당히 적었으나 ‘조성’은 9로써 월동 중에 잎의 손상이 상당히 많았다. 연천에서의 월동후 잎마름 정도는 ‘옹골진’은 5로써 중간 정도의 동해 피해를 나타냈고 ‘조성’은 9로써 심한 동해 피해를 나타냈다. ‘옹골진’은 수원지역보다 더 추운 연천지역에서도 월동 후 잎마름이 적어 생육재생기에 생육회복이 빠른 모습을 보여 내한성이 강함을 알 수 있었다(Fig. 4). 이러한 결과는 ‘옹골진’이 중북부 지역에서도 안정적인 재배가 가능함을 나타냈다.
전주, 수원, 청주, 강진, 대구, 진주 등 6개 지역 지역적응시험에서 평가한 ‘옹골진’의 내재해성은 Table 6과 같다. 도복정도는 1로 강하였고, 습해 피해는 나타나지 않았으며, 병에도 강한 특성을 보였다. 트리티케일은 밀과 호밀 유전체가 병합되어 있어 호밀과 마찬가지로 여러가지 재해에 강하다고 하였다(Blum, 2014;Mergoum et al., 2019). ‘옹골진’ 품종도 밀 재배 시 자주 발생하는 한해, 습해, 흰가루병이나 잎녹병 등에 대해 강한 특성을 보였다.
5. 조사료 생산성
출수 후 30일에 평가한 ha당 생초수량은 Table 7에서와 같다. 시험지 전체 평균에서 ‘옹골진’은 46.31톤으로 ‘조성’의 39.26톤에 비해 18% 많았다(p<0.05). 지역별로는 수원과 강진에서 각각 52.87톤, 58.58톤으로써 다른 지역보다 높은 수량을 보였고, 전주 에서는 39.43톤의 수량으로 다른 지역보다 다소 낮았다. ‘조성’은 수원에서 44.79톤의 수량으로 많았고, 전주와 대구에서 각각 32.39톤과 35.88톤으로 다른 지역보다 생초 수량이 낮았다.
‘옹골진’의 건물수량은 Table 8과 같다. 시험지 전체 평균에서 ha당 15.75톤으로 대비품종인 ‘조성’의 13.41톤에 비해 17% 많았다(p<0.05). 지역별 건물수량은 수원과 강진에서 각각 18.65톤, 17.38톤으로 높았고, 전주에서 13.74톤으로 낮았다. ‘조성’의 건물수량은 수원에서 15.54톤, 전주에서 11.69톤으로 낮았다. ‘옹골진’은 건물수량이 높은 지역(수원)과 낮은 지역(전주)과의 생산성 차이는 4.91톤으로 ‘조성’의 3.85톤보다 편차가 컸다. 그러나, 최저 생산 지역(전주)에서 ‘옹골진’의 건물수량이 ‘조성’보다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6. 사료가치
출수 후 30일에 지상부를 수확하여 평가한 ‘옹골진’의 조사료 품질특성은 Table 9와 같다. ‘옹골진’의 조단백질 함량은 6.2%로 ‘조성’의 6.7%보다 0.5%포인트 낮았으나 통계적인 유의성은 없었다. ADF와 NDF 함량은 각각 34.4%와 59.5%로 각각 31.8% 와 55.2%인 ‘조성’보다 높은 경향이었다. 따라서 ADF 함량을 기반으로 산출한 ‘옹골진’의 TDN 함량 또한 61.8%로 ‘조성’의 63.8%에 비해 낮은 경향이었다. 사일리지를 제조하고 40일 경과한 시료를 개봉하여 pH와 유기산을 분석한 후 Flieg 점수에 의해 판정한 사일리지 등급은 ‘옹골진’ 2등급, ‘조성’ 1등급을 나타냈다. ADF와 NDF는 구조 탄수화물인 세포벽 구성물질로 소화율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 사료가치 측면에서 중요한 요인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ADF와 NDF는 TDN과 부의 상관 관계를 가진다. 청보리의 경우 황숙기에 종실 부분에 전분 함량의 축적이 늘어나면서 TDN 함량이 증가된다고 하였고(Song et al., 2013), 국내 육성 초종에 따른 TDN 함량은 귀리, 이탈리안라이그라스, 청보리는 60% 내외, 호밀은 57%로 나타났다고 보고하였는데(Kim et al., 2015) 본 시험의 트리티케일 TDN 함량은 귀리, 이탈리안라 이그라스, 청보리와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사일리지 초종의 당분 혹은 가용성 탄수화물 함량이 높으면 양질의 젖산 발효가 일어나 젖산 함량이 높아져 pH가 낮아지며 Flieg 점수가 높이지고 Flieg 점수로 산출된 품질등급에서 탁월한 1등급 혹은 우수한 2등급을 갖는다. 국내 육성 귀리, 이탈리안라이그라스, 청보리, 호밀의 사일리지 실험에서 품질등급이 호밀은 2등급 그 외 초종은 1등급을 나타냈다(Kim et al., 2015). 본 시험에서 ‘조성’의 사일리지 등급이 ‘옹골진’보다 더 좋게 나타났는데 이는 ‘옹골진’이 구조적 탄수화물인 ADF와 NDF함량이 ‘조성’보다 높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되었다.
7. 종실 생산성
‘옹골진’의 종실수량성은 Table 10과 같다. ‘옹골진’의 이삭 수는 725개/㎡로 대조품종인 ‘조성’보다 많았으나 통계적 유의성은 없었다. ‘옹골진’의 이삭당 낟알수는 50개로써 대조품종인 ‘조 성’보다 많았고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있었다. ‘옹골진’의 천립중과 리터중은 각각 36.2 g, 699 g으로 대조품종인 ‘조성’보다 조금 가벼운 것으로 나타났다. ‘옹골진’의 종실 수량성은 ha당 평균 6.57톤으로 ‘조성’보다 약간 적었다(p<0.05). 따라서, ‘옹골진’은 ‘조성’에 비해 조사료 생산성은 많으나 종실 생산성은 약간 낮은 특성을 보였다. 이는 이삭당 종실수는 ‘조성’보다 많으나 천립중과 리터중이 가벼운 특성이 더 강하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생각된다. 국내에서 사료작물의 자급용 종자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종실 수량성 평가가 중요하다(Lukaszewski and Gustafson, 1987;Kim et al., 2020). 비록 ‘옹골진’이 ‘조성’보다 종실생산성이 적지만 종자 생산시 요구되는 증식율 30배인 ha당 4.2톤보다 더 많은 종자생산성을 나타내 종자생산에는 전혀 문제 없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Ⅳ. 요 약
트리티케일 품종 ‘옹골진’은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에서 동계작물 조사료용으로 2018년에 육성되었다. ‘옹골진’은 ‘조성’ 에 비해 잎몸 폭이 좁고 길이는 중간 정도인 녹색 잎을 지녔다. 이삭 길이는 짧고, 까락 길이는 길며 꽃밥의 안토시아닌 착색은 없다. 종실의 길이는 ‘조성’에 비해 짧고, 종피색은 황갈색이다. ‘옹골진’은 대비품종인 ‘조성’과 비교할 때 출수기가 전국 평균 4월 23일로 ‘조성’보다 2일 늦고, 내한성은 더 강하였으며, 내도복성과 내병성은 비슷한 수준이었다. 초장은 ‘조성’보다 더 길고, 생초수량은 ha당 평균 46.31톤, 건물수량은 평균 15.75톤으로 ‘조성’보다 각각 18%, 17% 더 많았다. ‘옹골진’의 조사료 품질특성은 조단백 함량 6.2%, NDF 함량 59.5%. ADF 함량 34.4%, TDN 함량 61.8%로 나타났으며, 사일리지 품질 등급은 2등급이었다. ‘옹골진’의 종실 수량성은 ha당 6.57톤을 나타냈다.